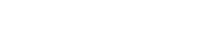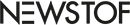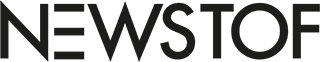스탠퍼드대 캠퍼스에는 일명 ‘고스트카(ghost car, 유령차)’가 돌아다닌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차, 외관엔 ‘Stanford Driverless Vehicle(스탠퍼드 무인자동차)’, 이런 글자가 박혀 있다. 스탠퍼드는 자율주행 연구에서 대표적인 대학이니 캠퍼스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돌아다니는 게 새삼스럽진 않다. 자율주행 부문 세계 최고라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Waymo)의 주역도 스탠퍼드 연구팀이었다.
'무늬만 자율주행차' 고스트카를 운전하는 이유는?
그런데 스탠퍼드 캠퍼스의 고스트카는 실은 무인차,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무인차라고 표시만 해 놓고 그럴 듯하게 꾸며놨지만 ‘무늬만 무인차’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lidar) 장치도 달려있는 듯 하지만 껍데기만 그럴듯한 가짜다. 이 차를 운전하는 건 인공지능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다. 밖에서 보면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교묘한 카시트(car seat)로 위장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스탠퍼드 캠퍼스의 고스트카는 디스쿨(d. school, 공식명칭은 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디스쿨은 스탠퍼드 내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의미하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으로 유명한 기관이다. 고스트카 프로젝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자율주행차와 보행자 사이 의사소통 ‘언어’를 만드는 연구.
지난해 말 스탠퍼드 고스트카 프로젝트 얘기를 지인에게 전해 듣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옥근 씨를 만났다. 그는 스탠퍼드대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늦깎이’ 대학원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99학번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7년 정도 모니터 개발 부문에서 근무한 뒤 영국 유학을 떠났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는 처음으로 디자인팀으로 옮겨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한다. 디자인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성전자 모니터 제품의 높낮이 조절에 기존 금속스프링 대신 가스스프링(gas spring)을 도입해 특허까지 출원한 일. 그러다가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접목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 영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런던에서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공부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다시 2년 가량 네이티브(Native)라는 영국 회사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했다. 네이티브는 헤드폰, 스피커 등을 만드는 B&W, 자동차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제품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다.
자율주행차와 보행자가 소통하는 법 연구하는 스탠퍼드 디스쿨
그러다 2018년 여름 스탠퍼드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디스쿨에서 고스트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정확히는 기계공학과 디자인연구센터(Center for Design Research) 내에 있는 디자인엑스(designX) 연구실 소속이다. 디자인엑스 연구실은 디스쿨 공동 설립자 중의 한 명인 래리 라이퍼(Larry Leifer) 교수가 이끄는 곳.
디스쿨은 스탠퍼드에서 독특한 기관이다.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 학생 등이 참여해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일종의 플랫폼이다. 별도 학위는 주지 않는다. 디스쿨 석사, 박사 이런 학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디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 학위는 기계공학 석사, 박사 학위다. 이옥근 씨도 디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계공학과 디자인엑스 연구실 소속이다.
그는 스탠퍼드 고스트카 프로젝트를 ‘자율주행차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으로 설명했다.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의미였다.
“자율차가 보행자와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게 고스트카 프로젝트예요.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거나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다가오는 자동차가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눈을 마주치고 어느 정도 사인이 오고 가죠. 그런 다음 보행자가 안심하고 건넙니다. 자율차가 상용화돼 (차 안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까? 그런 질문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연구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자율주행차 세상이 되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눈빛을 교환하고, 운전자가 손을 흔들어 보행자에게 건너가라는 표시를 하거나, 보행자가 손을 들어 지금 건너갈테니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질테니 새로운 신호체계, 소통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스트카 프로젝트를 ‘자율주행차와 보행자가 소통하는 일종의 언어’를 만드는 연구라고 부르는 건 그 때문이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수 년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자율자동차에 필요한 새로운 인터랙션을 찾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논문이 나온 건 사운드를 이용한 인터랙션인데요. 그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라이팅(조명)을 이용하는 연구도 하고 있죠. 또 사운드와 라이팅 이외에 어떤 인터랙션 방식이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보행자가 자율주행차를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주제 중의 하나다. 자율주행차는 현재 라이다 같은 장치가 달려 있어 외관에서 확연히 일반 자동차와 구분된다. 그는 라이다를 보고 자율주행차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한 눈에 자율주행차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건 자율주행차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당신이 마주한 게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라는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그는 현재 자율주행차에 달려 있는 라이다 같은 ‘갑툭튀’ 형태의 장치는 점차 매끄러운 외관으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외관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차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자이너들은 자동차를 좀 더 매끄러운(sleek) 형태로 디자인하길 원하거든요. 지금은 툭 튀어나온 형태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끄러운 형태로 변해갈 겁니다.”
연구팀은 보행자가 자율주행차를 알아볼 수 있는 보다 능동적 적극적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보행자가 차량을 보고 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이 먼저 보행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보행자의 위치, 시선 이런 정보까지 현재 기술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방향에 레이저 조명을 쏴서 어떤 신호를 준다든지, 자율주행차가 가려는 방향과 보행자에게 건너가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방향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씽킹'이란 인간 관점에서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
고스트카에 카시트처럼 위장하고 탑승하는 그에게 보행자들의 반응을 물었다. 자율주행차로 위장한 고스트카를 마주친 보행자들이 무덤덤하게 지나쳐 가는지, 아니면 깜짝 놀라는지 궁금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해 연구를 해왔는데요. 초기 연구자료 같은 걸 보면 처음엔 다들 놀라요. 자율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요. 실리콘밸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치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리액션이 있어요.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 내가 어떻게 길을 건너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게 보여요.”
그는 자신들의 연구가 학습효과를 증대시키는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학습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차라는 걸 알려야 돼요. 상용화 되는 순간 사람들의 학습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거든요. 학습효과를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것인가, 그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시각 효과, 사운드 등등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의 문제죠.”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연구는 느린 연구라고 말했다. 인간의 생명, 안전이 관련돼 있어서다.
“자동차는 보수적인 사업 영역이에요. 뭘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후미등 (신호) 하나를 바꾸려해도 법을 바꾸기 위해 많은 데이터와 기간이 필요해요. 휴대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건 그냥 (기존 제품을) 바꾸면 되거든요. 안전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만일 자율주행차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동차 깜빡이 시스템도 꽤 오랫동안 바꿔나간 것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역사가 있어요. 자율차는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인터랙션을 했을 때 좀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 ‘훨씬 더 쉽게 인식하더라’ 하는 걸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그는 디자인 씽킹이란 말을 수시로 했다. 스탠퍼드 박사과정에 진학한 것도 디자인 씽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불리는 디스쿨에서 연구하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고스트카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씽킹이란 뭘 의미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을 중심에 뒀다면 고스트카 프로젝트 같은 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센서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것만 볼 뿐 보행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을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해요. 디자인 씽킹 방법론에선 인간 관점에서 고민하죠. 인간(보행자, 운전자)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융합하려고 하죠.”
그는 자율주행차 자체의 기능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와 더불어 현재 자율차와 운전자(만일의 경우 자율차의 컴퓨터로부터 운전대를 넘겨 받을 운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엔 자율차와 보행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많은 연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보행자 관점에서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하는 연구”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