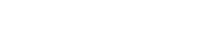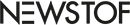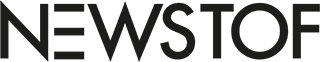9월 20일 오전 10:50분 연합뉴스에는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헝가리 연구진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최고의 탄성””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이 기사는 윤고은 홍콩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원본이다. 기사는 첫 단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해서 “실험실에서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을 가해도 죽거나 모양이 파괴되기는커녕 곧 원상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우선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므로, 학술적으로는 죽는게 아니라 불활성화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생명체인 숙주에 기생하지 못하면 복제를 할 수 없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연구진이 바이러스가 풍선처럼 터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입자를 “미세바늘”로 100번이나 찔렀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터지기는 커녕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다고 쓰고 있다. 도대체 이 미세바늘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사에는 헝가리 세멜바이스대학교의 연구진이라는 말만 써 있을 뿐, 해당 논문에 대한 문헌정보도, 홍콩 신문사의 기사 링크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이 외국 언론의 과학기사를 받아쓸 때 가장 전형적으로 범하는 도덕적 해이가 바로 해당 기사가 다루는 논문의 정보와 외국 언론 기사의 원본 링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과학기사의 진위가 궁금한 독자는 한글로 쓰인 외국어 이름과 학술지명을 영어로 추측해서 직접 구글에 검색을 해야한다. 이게 얼마나 귀찮고 어이 없는 작업인지는 차치하고, 도대체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기사에 왜 외국 언론의 원본기사와 논문 정보가 포함될 수 없는지 궁금하다. 혹시 수준 높은 독자들이 원본을 찾아 읽고 한국 언론에 실린 기사가 번역기를 돌린 수준인지 알아차릴까봐 그러는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정도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주요신문사인 중앙일보의 특파원은 칼럼을 아예 대놓고 베낀 적도 있었으니, 이런 의심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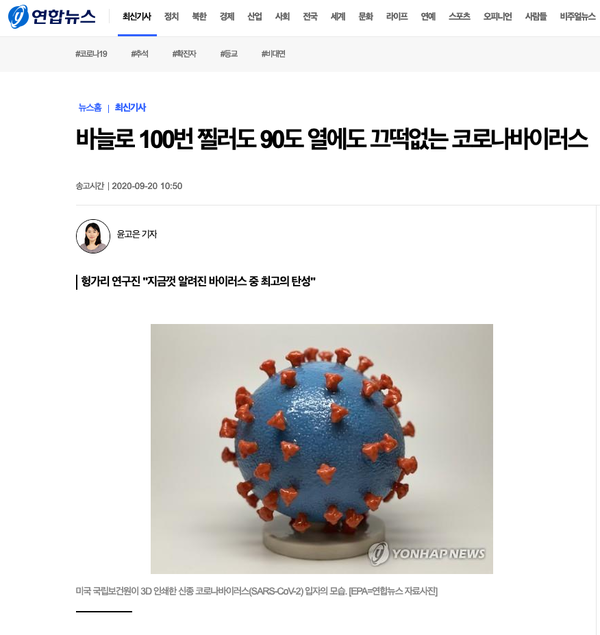
구글에서 SCMP와 헝가리라는 검색어로 연합뉴스가 참고한 원본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연합뉴스의 기사는 이 기사를 번역하고 요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SCMP의 기사에도 연합뉴스와 똑같은 표현, 즉 미세바늘로 바이러스를 찔렀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것도 100번이나 찔렀다는 똑같은 표현으로 말이다. 그나마 해당 기사에서는 헝가리 연구진의 책임연구자 이름이 미클로스 켈러매이어 Miklos Kellermayer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이 정보를 근거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생물학의 출판전 논문 플랫폼인 바이오아카이브 bioRxiv에 실제로 업로드되었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아카이브에 업로드된 프리프린트는 정식으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아니다. 프리프린트, 즉 출판전 논문이란 연구결과가 학술지의 동료평가를 통과해 정식으로 학술지에 실리는 시간 동안 미리 출판전 논문의 형태를 서버에 업로드해서, 연구공동체와 대중에게 빠르게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프리프린트에 관해서는 내가 동아사이언스에 쓴 [보통과학자]의 과학출판 관련 기사들을 참고할 것. 과학출판도 변해야 한다). 즉, 프리프린트는 연구자들이 논문 출판 전에 빠르게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일 뿐, 정식으로 동료평가를 통해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는 다르다. 검증된 과학연구결과는 프리프린트가 아니라 학술지에 논문의 형태로 실리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연합뉴스와 SCMP의 기자가 프리프린트가 과학계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면, 이런 호들갑스러운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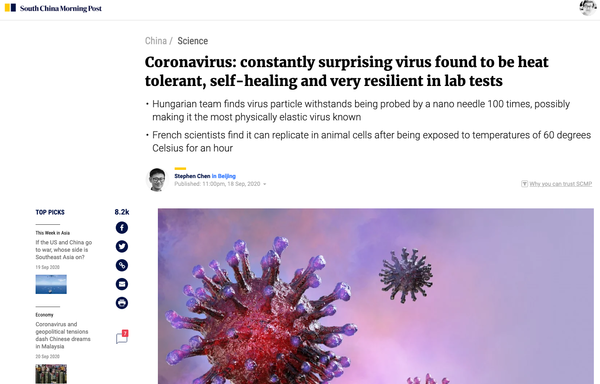
SCMP의 정보를 토대로 바이오아카이브의 논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의 제목을 번역하면 “개별 SARS-CoV-2 바이러스 입자의 토포그래피와 스파이크 동역학, 그리고 나노메카닉스”로, 용어 대부분이 한국말로 번역조차 되지 않는 전문적인 학술용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논문에는 바늘 needle, 미세바늘 microneedle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즉, 바늘이라는 표현은 이 논문을 처음으로 기사화한 언론사가 독자들이 이 연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유로 등장시켰을 것이다. 그럼 이 프리프린트를 가장 먼저 인용한 언론기사를 찾으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기사가 SCMP의 스티븐 첸 Stephen Chen이라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이 쓴 것이다. 바로 해당 기사에서부터 연구진이 바이러스를 바늘로 찔렀다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 표현을 직역해서 바늘로 사용했고, 다른 한국언론들은 모조리 연합뉴스의 기사를 베낀 셈이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의 껍질의 특성을 나노과학 기법으로 연구한 이 프리프린트는, 졸지에 바늘로 풍선을 찌르는 과학연구로 소개되었다.

한국의 언론은 모두 SCMP의 기자가 한 실수를 그대로 베꼈지만, 모든 언론이 그런건 아니다. 외국 언론 중에선 과학저널리즘의 기본을 보여주는 기사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SCMP의 기사가 나오고 이틀후에 기사화된 ‘News Medical’이라는 언론사의 기사를 보자. 2004년 시작된 이 언론사는 의학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데, 이 기사에는 바늘이라는 표현이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 기사의 제목은 “연구자들이 AFM (원자현미경)의 뾰족한 끝으로 SARS-CoV-2를 터뜨리려고 했고, 바이러스 입자가 놀라울 정도로 탄력성을 지녔다는걸 발견하다”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해당 논문의 실험방법을 정확하지만 최대한 쉽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예를 들어 AFM이라는 원자현미경으로 작은 입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다는걸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원본이 된 프리프린트의 논문그림을 이용해서 AFM의 뾰족한 끝이 바이러스 입자에 닿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바이러스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측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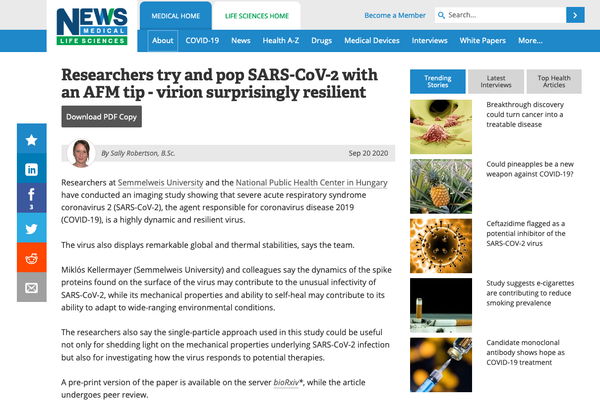
샐리 로버트슨 Sally Robertson이라는 기자는 프리프린트의 내용과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적절히 섞어, 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기사의 가장 밑에는 바이오아카이브가 프리프린트 서버이며,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전출판 논문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이 프리프린트의 인용정보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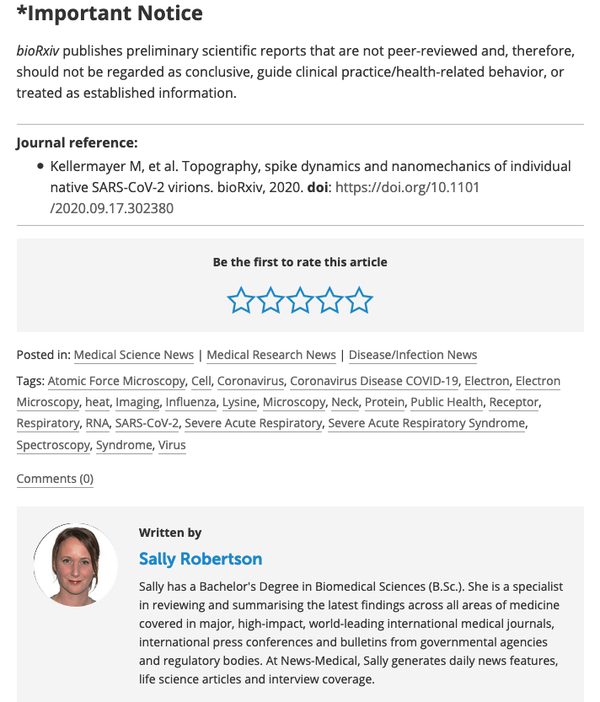
즉, 기자가 조금만 정성을 기울여서 기사를 작성한다면 외국언론에 나온 기사의 소스를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과학저널리즘의 기준에 합당한 과학기사를 쓰는건 가능한 일이다. 혹자는 이 언론사는 의생명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럼 이 기사를 작성한 샐리 로버트슨의 약력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그는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이 아니라 생물학 학사를 마치고, 과학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과학저널리스트일 뿐이다. 즉, 이런 전문인력이 한국에 부족한 이유는 한국 언론사 대부분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사를 전적으로 외국 기사의 번역으로 대체해온 부끄러운 역사가 녹아 있는 것이다. 한국 언론엔 과학보도는 있지만 과학저널리즘은 없다. 황우석 사태를 겪고 나서도, 언론은 과학저널리즘을 체계적으로 키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홍콩의 과학자 옌리멍의 코로나 바이러스 음모론이 한국 언론에 대서특필된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과학저널리즘의 역할을 연구현장의 과학자들이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무려 과학기자협회가 존재하고, 과학기자협회가 과학계에 막강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는데 말이다. 과학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