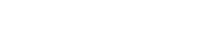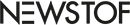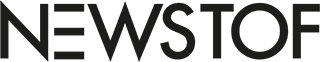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은 5월 13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다. 7⅓이닝 노히트 노런을 포함해 1피안타 9탈삼진 1볼넷을 기록했고 팀의 6-0 승리로 시즌 5승을 달성했다. 지난 8일(한국시간)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 경기에서 9이닝을 혼자 던지며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봉승을 해냈다.
8일 경기에서 류현진은 상대 타자들에게 볼넷을 단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개막 이후 52⅓이닝 동안 내 준 볼넷은 고작 세 개다. 지금 페이스라면 20세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볼넷이 적은 투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규정이닝 기준으로 이 부문 기록은 2005년 미네소타 트윈스 투수였던 카를로스 실바가 갖고 있다. 실바는 이해 188⅓이닝을 던지며 볼넷을 9개만 허용해 화제를 모았다. 9이닝당 볼넷(BB/9)은 0.43개였다. 애틀랜타전 이후 류현진의 기록은 0.41개였고 워싱턴전 이후 현재 0.52개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전체 역사로 범위를 넓히면 더 엄청난 투수들이 등장한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레퍼런스닷컴에 따르면 역대 시즌 최소 BB/9 기록은 1876년 내셔널리그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에서 뛰었던 조지 제틀레인이 갖고 있다. 이해 234이닝을 던지며 볼넷을 여섯 개만 내줬다. 9이닝당으론 0.23개다. 이해 신시내티 레즈 투수 체로키 피셔는 229⅓이닝 6볼넷을 기록해 제틀레인의 뒤를 잇는다. 하지만 당시는 지금과 볼넷에 대한 기준이 틀렸다. 볼‘넷’도 아니었다.
야구는 원래 치고 달리는 게임이다. 야구에서 점수를 ‘런(Run, 달리다)’이라고 하는 데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치면 자신, 혹은 기존 주자들이 베이스를 거쳐 홈 플레이트를 밟는 것으로 득점이 이뤄진다. 수비 팀은 득점이 완성되기 전에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아 이닝을 마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원래 야구에서 투수의 임무는 타자를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타격(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좋은 공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좋은 공을 던져줬는데도 치지 못하면 타자 실수로 간주됐다. ‘헛스윙 세 번이면 아웃’이라는 삼진 아웃은 최초의 야구규칙인 1845년 니커보커룰에도 규정돼 있다.
삼진은 타격 행위 없이도 수비 팀이 얻을 수 있는 아웃카운트다. 공격 팀에서 타격 없이 가능한 출루가 볼 네 개면 1루로 걸어나가는 ‘베이스온볼스(Base in Balls, BB)’다. 일본과 한국에서 규칙상 공식용어는 ‘4구’다. 한국 언론에선 과거 일본식 영어인 ‘포볼’을 많이 썼지만, 프로 출범 이후 ‘볼넷’으로 대체돼 왔다. MBC 해설위원 허구연씨가 1980년대에 제안한 용어다.
삼진과는 달리 볼넷은 니커보커룰에 없는 규정이다. 최초에는 ‘볼넷’이 아니라 ‘볼셋’이었다. 1864년 규칙 개정으로 심판은 투수가 1차 경고 뒤에도 다시 치기 어려운 공을 던지면 ‘언페어볼’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언페어 볼이 세 번이면 타자는 1루 출루권을 얻었다.
‘볼셋’의 등장에는 이유가 있다. 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투수들은 삼진 아웃으로 타자를 잡고 싶어했다. 그래서 공을 더 빠르게, 더 치기 어려운 곳으로 던지려 했다. 타자들은 이런 공을 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 초창기 야구에는 오직 헛스윙만이 스트라이크였다. 이후 스윙이 없어도 선언되는 콜드스트라이크 개념이 도입됐지만 한동안 제3스트라이크는 반드시 헛스윙이어야 했다. 타자가 공을 치지 않고 투수가 공을 하염없이 던지면 경기는 지루해진다. 메이저리그가 출범하기 전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야구는 이미 유료 관중을 받는 비즈니스였다.
새 규칙은 심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들은 새로 생긴 ‘임무’를 좋아하지 않았다. 타격 없는 출루(베이스 온 볼스)라는 개념은 선수에게도 낯설었다. BB의 별칭은 ‘워크(Walk)’다. 야구의 기본이랄 수 있는 ‘런’과 대조되는 말이다. ‘야구라면 뛰어야지, 걷는 게 웬 말?’이라는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규칙 도입 뒤 걸어나가는 출루를 거부한 타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긴 야구 역사에서 볼넷이 가치 있는 공격 방법이라는 생각이 통용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른바 세이버메트리션들이 볼넷의 득점 가치를 계산하고 2000년대 초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머니볼 혁명을 일으킨 뒤의 일이다.
1875년은 최초의 메이저리그인 내셔널어소시에이션의 마지막 시즌이다. 이해 54승 28패를 기록한 기록한 하트포드 다크블루스 팀 투수들은 도합 770이닝을 던져 BB를 11개만 내줬다. 이 팀의 에이스 캔디 커밍스가 416이닝 동안 기록한 BB는 고작 4개다. 당시 투수들의 제구력이 엄청나서가 아니었다. 심판들이 BB 판정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
1876년 내셔널리그 창설과 함께 규칙 수정이 이뤄졌다. 경고 과정을 생략하고 볼 판정으로만 BB 출루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판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875년 내셔널어소시에이션에서 리그 평균 0.36개던 BB/9이 0.64개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 야구와는 거리가 있는 수치다. 1876년은 위에서 언급한 제틀레인이 BB/9 0.23개, 피셔가 0.24개를 기록한 시즌이었다.
당시 BB 출루에 필요한 볼 개수가 지금의 4개와는 큰 차이가 있는 9개였기 때문이다. 이 개수는 1880년 8구, 1882년 7구, 1884년 6구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889년에는 4구로 줄어들어 오늘날과 같은 ‘볼넷’이 됐다.
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수가 1875년 하트포드 에이스였던 커밍스다. 커밍스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커브의 발명자’로 헌액돼 있다. 최초 발명자에 대한 이견은 많지만 커밍스 이후 투수들은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했고 투타 균형이 투수 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투수들에게 핸디캡을 주기 위해 프리 패스에 필요한 볼 개수를 줄이는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1884년 오버핸드 스로가 용인돼 투수들이 더 빠른 공을 던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내셔널리그 첫 해인 1876년 0..64개던 BB/9은 1880년(8구) 1.10개로 늘어났고 1882년(7구) 1.43개, 1884년(6구) 2.04개로 늘어났다. 4구 베이스온볼스 규정이 첫 적용된 1889년에는 3.49개가 됐다. 올해 내셔널리그 평균인 3.45개와 거의 같은 수치다.
이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규칙 변화를 거쳐 1901년 양대리그 체제가 성립될 시점에 비로소 ‘현대 야구’는 틀을 잡았다. 그래서 통상 메이저리그 기록을 다룰 때 20세기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다. 과거의 일을 해석할 때 당대의 상황과 환경에 주의해야 한다는 건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